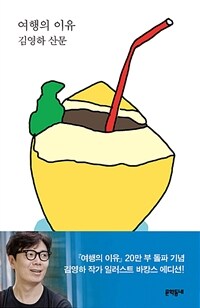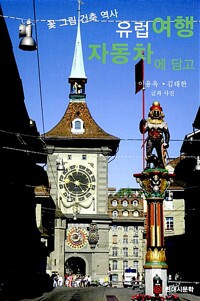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5917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591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그동안 이병률 작가의 책은 우리의 엉덩이를 자꾸만 들썩이게 해왔지만 실은 가장 떠나고 싶었던 사람은 작가 스스로였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떠나야만 했을 것이다. 자꾸 집을 비우고 길 위에 있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사람’은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사랑해서 떠나고, 미워해서 떠난다. 물론 둘 다의 감정으로도 떠난다. 그리고 대체로 ‘곁’이 아닌 ‘옆’의 사람이 그 주범이 된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옆’은 ‘곁’보다 훨씬 더 밀착된 상태이다.
‘여행’이란 여전히 풍경을 관광하는 것이 아닌 사람 사이로 걸어들어가는 일이라 믿는 사람의 눈앞에는 실제로 많은 것들이 펼쳐진다. 전작에서는 주로 여행길에서 맞닥뜨린 한 장면을 영화의 스틸컷처럼 포착하여 보여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장면의 앞과 뒤로 이어지는 서사에 집중하고 있다. ‘보는’ 여행에서 ‘듣는’ 여행으로의 전환이라 하면 어떨까. 많이 듣고, 끄덕이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내면에 쌓이는 것들이 많았겠다.
그곳에서 작가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 혹은 어느 한 사람의 뒷모습, 그 사람이 남기고 떠난 발자국, 그런 것들을 몰래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는 일이 많았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계절만큼이나 뚜렷하게 서늘했다 뜨거웠다 이내 차가워지기도 하는, 그 알록달록한 마음의 움직임으로 사랑도 삶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 산과 바다를 지척에 두고 살아온 우리만의 고유한 색깔들이 삶이라는 스케치북 위에서 어떻게 채색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행들은 굳이 여행이라 명명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확장이며 연장선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부러 짐을 챙겨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그저 발길을 따라 생활의 배경을 잠시 옮기는 것뿐. 일상을 여행으로 여기며 사는 태도를 가진 자에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함께 시(詩) 캠프를 떠난 사람들과 계룡산 계곡에 앉아 시를 낭송하던 시간, 제주도의 한 동물원에서 조용히 돌고래와 조우한 일이라든지, 어느 한적한 진안 버스터미널에서 마주친 남자와 여자 사이를 짐작하기도 하고, 오래전 잘 따르던 흑산도 소년을 무려 어른이 되어서 재회한 일, 공항에서 뒤바뀐 다른 사람의 여행가방을 들고 집으로 온 해프닝, 한때 문경 여행길에서 스치듯 인연이었던 어르신의 부고(訃告)를 듣고 그 집에서 머물게 된 하룻밤, 한겨울 태백에서 자동차 바퀴가 눈에 파묻혀 고생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 도와주고 떠난 사내, 한글학교에서 만난 베트남 친구와 함께했던 단양으로의 여행 등등…….
이 책에 존재하는 각각의 산문은 아주 평범한 일상 같기도 하지만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이 만들어내는 굉장한 이야기로 확장된다. 그것은 스스로 칭하기를 ‘예술을 하고’ ‘영감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시인(詩人)이기에 가능한 열린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 아름다운 감각과 세심하게 선택된 시적 언어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은 묘한 운율감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는 절로 뒤가 궁금해진다. 함축적이면서도 맥락을 관통하는 단어들은 늘 곁에 두고도 질리지 않는 집밥처럼 푸근한 풍경 앞에서 겹쳐지며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저 길을 걷다 자연스레 포착해낸 사진 속 앵글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도 크게 다르지 않게 연결된다. 특히나 이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수록된 사진의 절반 이상이 필름카메라로 찍은 것이며, 이는 투박하지만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진한 사람 냄새와 여운을 남긴다.
그래서일까. 이 책을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나면, 작가가 떠났던 여행길에 동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를 중간쯤 나가 마중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조금은 속을 들여다본 심정이 되고 마는 것은 그저 기분 탓일까.
혹시나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목차나 페이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같은 책을 나누어 읽다가 문득 전화를 걸어 “지금 OO쪽 펴서 읽어봐”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중간쯤?” “아니, 중간보단 조금 앞에?” “바닷가 앞에서 남자랑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사진 보여?” “그 바로 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서로를 가늠하고 추측하는 과정 어딘가에 이 책은 존재한다.
하지만 『끌림』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를 통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여행에는 정해진 시작도 끝도 없음을. 내가 읽기 시작한 곳이 여행의 시작이자 내가 책을 덮는 순간이 여행의 마지막임을. 어느 볕 좋은 날, 나른함을 이기지 못하고 책장 사이 잠시 손가락을 끼워놓은 채 꾸벅꾸벅 졸다가 손에서 책을 놓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천연덕스럽게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음을.
‘여행’이란 여전히 풍경을 관광하는 것이 아닌 사람 사이로 걸어들어가는 일이라 믿는 사람의 눈앞에는 실제로 많은 것들이 펼쳐진다. 전작에서는 주로 여행길에서 맞닥뜨린 한 장면을 영화의 스틸컷처럼 포착하여 보여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장면의 앞과 뒤로 이어지는 서사에 집중하고 있다. ‘보는’ 여행에서 ‘듣는’ 여행으로의 전환이라 하면 어떨까. 많이 듣고, 끄덕이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내면에 쌓이는 것들이 많았겠다.
그곳에서 작가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 혹은 어느 한 사람의 뒷모습, 그 사람이 남기고 떠난 발자국, 그런 것들을 몰래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는 일이 많았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계절만큼이나 뚜렷하게 서늘했다 뜨거웠다 이내 차가워지기도 하는, 그 알록달록한 마음의 움직임으로 사랑도 삶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 산과 바다를 지척에 두고 살아온 우리만의 고유한 색깔들이 삶이라는 스케치북 위에서 어떻게 채색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행들은 굳이 여행이라 명명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확장이며 연장선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부러 짐을 챙겨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그저 발길을 따라 생활의 배경을 잠시 옮기는 것뿐. 일상을 여행으로 여기며 사는 태도를 가진 자에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함께 시(詩) 캠프를 떠난 사람들과 계룡산 계곡에 앉아 시를 낭송하던 시간, 제주도의 한 동물원에서 조용히 돌고래와 조우한 일이라든지, 어느 한적한 진안 버스터미널에서 마주친 남자와 여자 사이를 짐작하기도 하고, 오래전 잘 따르던 흑산도 소년을 무려 어른이 되어서 재회한 일, 공항에서 뒤바뀐 다른 사람의 여행가방을 들고 집으로 온 해프닝, 한때 문경 여행길에서 스치듯 인연이었던 어르신의 부고(訃告)를 듣고 그 집에서 머물게 된 하룻밤, 한겨울 태백에서 자동차 바퀴가 눈에 파묻혀 고생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 도와주고 떠난 사내, 한글학교에서 만난 베트남 친구와 함께했던 단양으로의 여행 등등…….
이 책에 존재하는 각각의 산문은 아주 평범한 일상 같기도 하지만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이 만들어내는 굉장한 이야기로 확장된다. 그것은 스스로 칭하기를 ‘예술을 하고’ ‘영감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시인(詩人)이기에 가능한 열린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 아름다운 감각과 세심하게 선택된 시적 언어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은 묘한 운율감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는 절로 뒤가 궁금해진다. 함축적이면서도 맥락을 관통하는 단어들은 늘 곁에 두고도 질리지 않는 집밥처럼 푸근한 풍경 앞에서 겹쳐지며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저 길을 걷다 자연스레 포착해낸 사진 속 앵글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도 크게 다르지 않게 연결된다. 특히나 이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수록된 사진의 절반 이상이 필름카메라로 찍은 것이며, 이는 투박하지만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진한 사람 냄새와 여운을 남긴다.
그래서일까. 이 책을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나면, 작가가 떠났던 여행길에 동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를 중간쯤 나가 마중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조금은 속을 들여다본 심정이 되고 마는 것은 그저 기분 탓일까.
혹시나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목차나 페이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같은 책을 나누어 읽다가 문득 전화를 걸어 “지금 OO쪽 펴서 읽어봐”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중간쯤?” “아니, 중간보단 조금 앞에?” “바닷가 앞에서 남자랑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사진 보여?” “그 바로 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서로를 가늠하고 추측하는 과정 어딘가에 이 책은 존재한다.
하지만 『끌림』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를 통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여행에는 정해진 시작도 끝도 없음을. 내가 읽기 시작한 곳이 여행의 시작이자 내가 책을 덮는 순간이 여행의 마지막임을. 어느 볕 좋은 날, 나른함을 이기지 못하고 책장 사이 잠시 손가락을 끼워놓은 채 꾸벅꾸벅 졸다가 손에서 책을 놓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천연덕스럽게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음을.
목차
목차 없는 상품입니다.